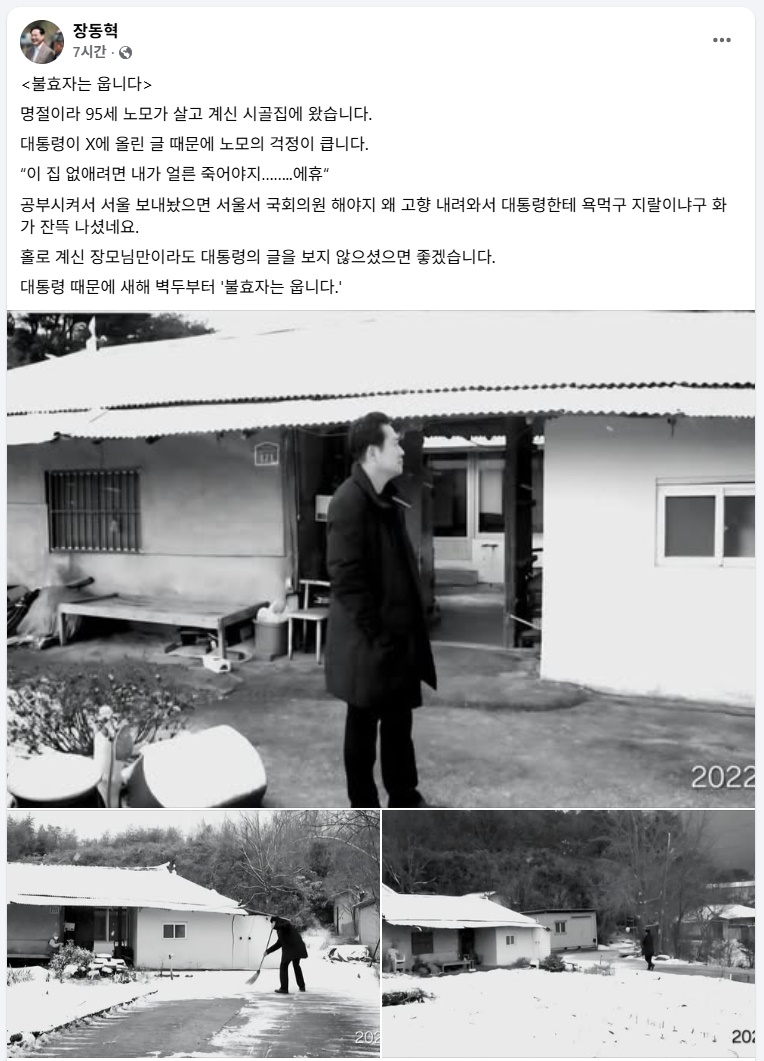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2000조 원 턱밑까지 차올랐다. 올해 2분기 ‘영끌’ ‘빚투’의 기승으로 가계신용이 25조 원 가까이 폭증한 탓이다. 가계빚이 사상 최대를 갱신한 가운데 새로 뽑힌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기대가 쏠리고 있다. ‘금융 투톱’이라 할 두 사람이 가계빚 증가 속도를 늦추고,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금융을 생산 및 포용금융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을지 시장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이제 2000조 원이 가시권에 들어간 가계빚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 지난해 1분기 3조 1000억 원 줄었지만,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잔액은 1분기 말(1928조 3000억 원)보다 24조 6000억 원이나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개시 이래 가장 많다. 분기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 원) 이후 최대 규모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과 ‘빚투'(대출로 투자)로 급증한 주택·주식 등 자산 투자가 2분기 가계신용잔액을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인이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 6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1809조 5000억 원)보다 23조 1000억 원 불었다. 증가액이 전 분기(+3조 9억 원)의 약 6배에 이른다. 경악할 만한 증가 폭이 아닐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15조 폭증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8조 넘게 증가
올해 2분기 가계신용잔액의 기록적 폭증에는 어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도사리고 있다.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무섭게 늘었다.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잔액 1148조 2000억 원)은 14조 9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684조 4000억 원)도 8조 2000억 원 증가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331조 2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8.8%를 차지했다. 전 분기 대비 2조 6000억 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잔액 993조 7000억 원)이 석 달 사이 19조 3000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기타대출이 3조 3000억 원 각각 불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4조 2000억 원)도 3조 원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1분기 1조 원보다 무려 3배로 뛰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24조 7000억 원) 역시 9000억 원 늘었다.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안할 때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신임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억원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모두 출근 첫날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정부 의 6·27 대책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며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LTV 강화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공급 축소 방안 등 여러 ‘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시 즉각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 LTV 비율을 40% 이하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예상이다.
지난달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데 이어 추가로 보증비율을 낮춰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지만, 서민 자금이나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커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마련이 된 상태”라면서도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된 만큼 방안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선명히 밝힌 상태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포용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는 난제 해결을 맡은 금융 투톱
한편 금융 투톱에게는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이자놀이’를 경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 대신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부동산 등 지대추구에 경도된 기존 금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투톱의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녹록치 않다. 이재명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에 총력을 경주해야 가까스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시금석은 금융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하향안정화 없이 부동산에 쏠린 금융의 물꼬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건 동그란 네모를 그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