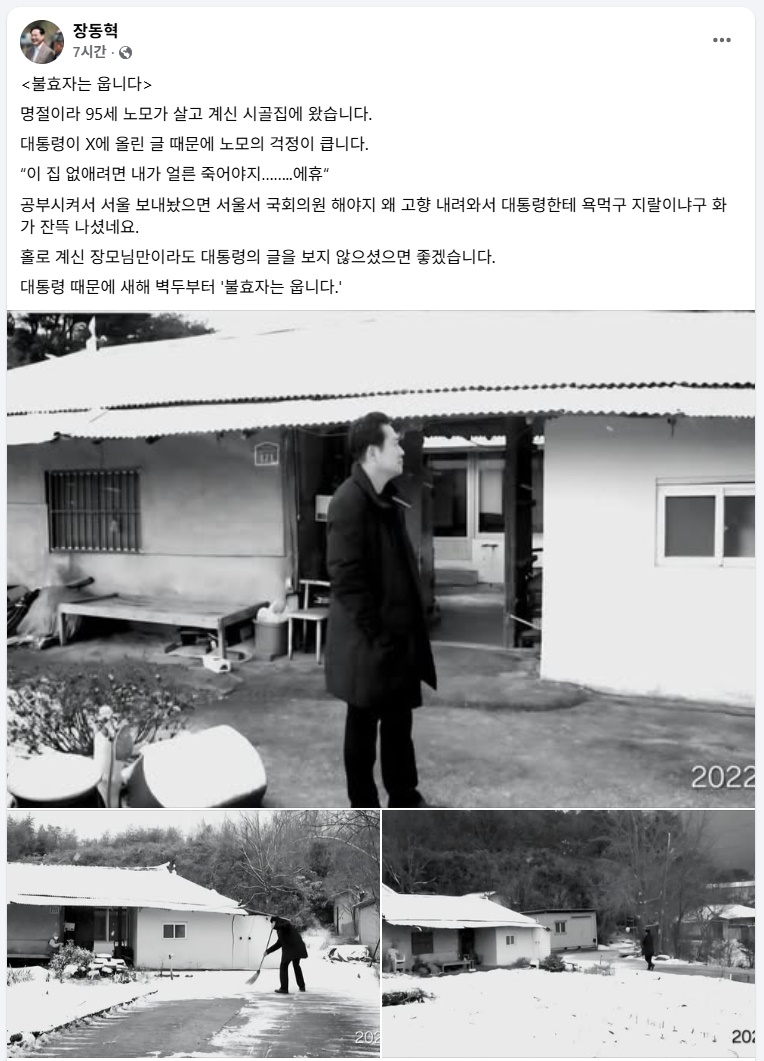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상반기 매매계약 취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월 100건 안팎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지난 6월에는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3건 중 1건이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는 사실이다. 아파트가격이 비싼 지역의 거래 취소 비율이 높았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거래 정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근간으로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을 띄울 목적으로 작당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교란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고 시세조작 행위를 적발해 처벌할 ‘부동산감독원’의 신설이 시급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최소 월 100건대에 1000건까지 증가
지난달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중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1067건을 기록했다.
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급기야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건수는 월 100건 수준에서 4년새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이었는데 올해 2월 5%를 넘어섰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고가로 거래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서초구(66.1%),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순으로 높다. 대체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계약 해지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최고가 중심으로 계약 취소 폭발적 증가 추세
올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건수는 특히 최고가 중심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이 1433건으로 36.5%였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이어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6월에는 최고가로 거래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9개 구에서는 50%를 초과했다. 서초구(75.0%), 용산구(75.0%), 광진구(69.6%), 동작구(61.5%), 성동구(60.0%), 마포구(59.7%), 강남구(57.8%), 송파구(56.8%), 양천구(50.8%)등이다.
유독 아파트 가격이 비싼 자치구에서 최고가 계약취소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세조작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최고가로 거래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사례는 계약일과 해제사유 발생일의 간격이 길수록 기존 신고가격이 높았다. 전체 해제건수의 계약일과 해제사유발생일의 격차는 평균 29일이며, 15일 미만(37.8%), 15~30일 미만(23.9%), 60일 이상(16.6%), 30~45일 미만(12.5%), 45~60일 미만(9.2%) 순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 해제신고를 하는 비율은 35.2%에 달했다. 해제건수의 기존 신고가격은 평균 13억 1618만 원인데, 해제까지 60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15억 8146만 원이었다. 해제를 늦게 할수록 신고 가격이 높았다.

신고가 거래 취소 후에 신고가 랠리 지속돼
신고가 거래 취소가 문제되는 건 시장이 뜨는 국면에서는 설사 해당 단지의 신고가거래가 취소된다 해도 해당 단지에서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면적 59㎡ 평형은 지난 5월 10일 22억 7000만 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계약은 한 달 반 뒤인 지난 6월 25일 해제됐다. 문제는 그 사이 이 평형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이다. 5월 17일 23억 5000만 원에, 6월 8일 26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릴레이 신고가’ 기록을 썼다. 나아가 지난달 14일에는 무려 28억 5000만 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이런 사례는 많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83.4㎡같은 경우 2025년 3월 14일 90억 원으로 신고된 거래는 7월 18일 해제됐다. 해제사유 발생일 이전 약 4개월간 90억 원을 초과하는 5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최고가는 6월 23일 무려 112억 5000만 원을 찍었다. 그러나 8월 14일까지 등기가 완료된 계약은 6월 1일의 101억 원짜리 단 1건밖에 없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더샵 85.0㎡ 평형도 3월 7일 18억 원, 4월 29일 18억 8000만 원으로 신고된 거래가 4월 30일 동시에 해제됐다. 하지만 3월 7일부터 4월 30일 사이 3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3월 21일 19억 5000만 원에 거래신고된 건이 최고가를 갱신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업계 관계자는 “고가 계약 소문만으로도 패닉바잉이 발생하는데 이후 취소 소식이 들리면 시장은 더욱 동요한다”며 “이로 인해 실거래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 시그널이 왜곡되면 매수·매도 양측 모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거래 정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가격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을 비롯해 시장경제를 시장경제답게 만드는 필수장치다. 그런데 이 가격시스템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교란된다면, 시장경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작행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작행위를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신설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