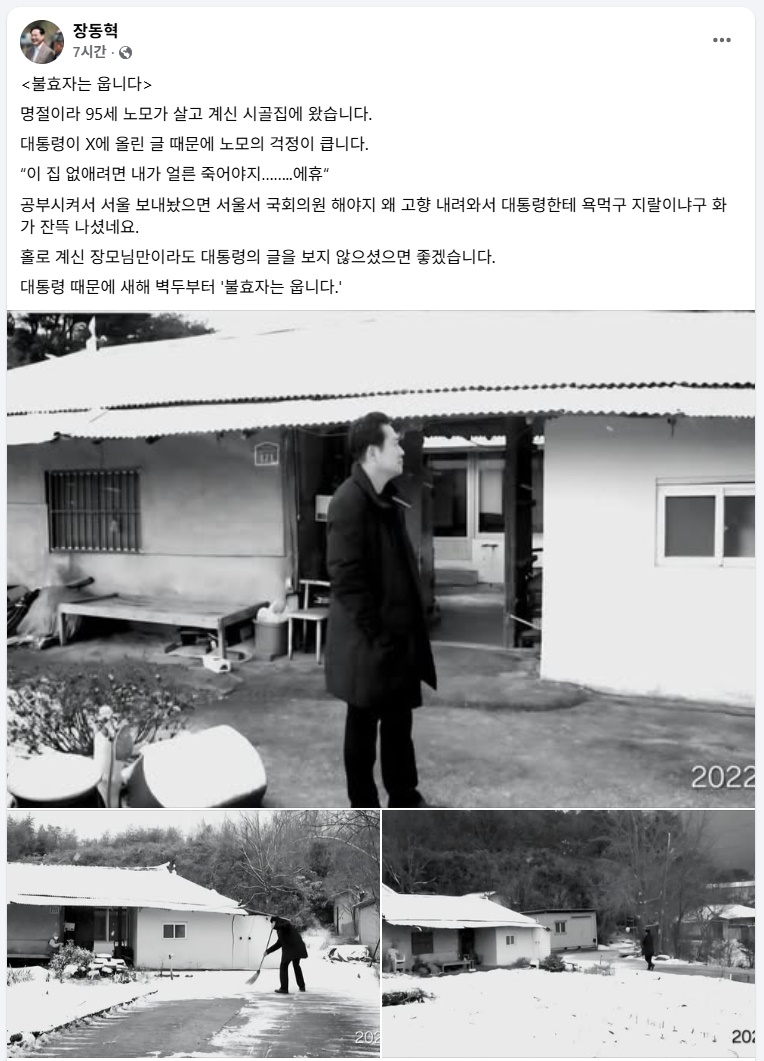가계빚 증가 걱정하며 금리 동결하는 이창용의 모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예견됐던 일이고 이창용의 한국은행다운 선택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건 이창용 총재가 기자들과 한 일문일답 중 가계대출과 관련된 대목이었다. 가계부채 증가를 근심하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도 염려하는 이 총재를 보면서 임계점에 도달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에 한은이 역할을 하는 걸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임을 알겠다.
부동산 연착륙 위한 유동성 공급과 중장기적 가계대출 디레버리징 병존 가능?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한 후 이창용 총재가 기자들과 한 인터뷰 중 관심을 끈 건 가계부채 및 부동산과 관련된 대목이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중 해당 부분이다.
= 6월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가계부채 문제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를 표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70년간 1997년 외환위기, 2003∼2005년 카드 사태, 코로나19 사태 이후 등 몇 번의 위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103%로 내려왔는데,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최근 부동산 PF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이 예일 것이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자금 흐름 물꼬를 트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시적 대응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은 정책당국과 한은 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와 함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며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하고 대응하자는 게 저와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다.
앞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여러 정책 대응 옵션이 있고, 금통위원들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한은이 긴축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대출이 늘면서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우려스럽지만 미시적 정책을 하지 않아서 전세 자금이 안 돈다거나, 금융 불안정이 생겼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정교하게 양쪽을 다 보며 해야 한다.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 등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미시적으로 자금시장 물꼬를 틀 필요가 있어서 하는 정책이고, 이 자체가 (거시적 통화정책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책 공조가 잘 된다고 볼 수도 있고, 통화정책이 무용화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는 조금 지난 뒤에 하면 좋겠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특정한 때를 제외하곤 지난 70년간 계속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GDP 대비 103%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근심한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부동산 PF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이 부동산과 연결돼 있으므로 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돈줄을 푸는 미시적 대응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재미있는 건 이 총재가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시적 대응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다. 확장적 미시 정책을 사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이 총재가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짙게 든다.
이 총재도 부동산의 인질이 된 것인가?
이 총재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총재는 부동산 PF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을 부동산 연착륙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기실 부동산 PF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은 흔히 말하는 시스템 위기로 번질 휘발성이 매우 낮은 재료들이다.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해 도와줘야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정부의 유동성 공급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한 일부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생명을 연장시켜 좀비기업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역전세 임대인들에게 대출을 더 해줄테니 집을 팔지 말라고 정부가 떼를 쓰는 건 어떤 근거와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시장적 조치에 불과하다.
윤 정부야 집값 떠받치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한 정부이니 논외로 치자. 놀라운 건 이 총재마저 집값 떠받치기(연착륙이 아니다)의 수단들에 불과한 정부의 반시장적 대책들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혹시 이 총재도 입으로는 부동산 연착륙을 말하지만, 부동산 하락이 너무 두려운, 부동산의 포로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 대비 2030조 원(11.4%) 증가한 1경 9809조 원으로 집계됐다. 명목 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6.8%, 6.7%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 GDP(2072조 원)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9.2에서 9.6으로 크게 상승했고,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11.4에서 11.9로 상승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자산이다. 부동산 자산이 1경 6873조 원으로 국가 순자산의 85.2%를 차지하는데 토지자산이 전체 부동산 자산의 63%에 해당하는 1경 680조 원을 차지한다. 한편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은 6098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5053조 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합한 국부는 1경 6644조 원에 달한다.
토지자산과 주택자산의 팽창 속도는 가히 경악할 수준이다. 1995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437조 원이었고 토지자산은 1725조 원이었다. 국민소득 대비 지가총액 배율은 3.95배였다. 주택시가총액은 831조 원으로 국민소득 대비 1.9배였다. 외환위기를 통과하면서 주춤하던 토지자산과 주택자산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토지가격배율은 2006년에 4.15배, 2007년 4.38배를 거쳐 작년에는 5.2배까지 올라왔다. 주택가격배율은 2015년 2.27배에서 2021년 3.14배까지 폭등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6년간 주택시가총액은 3762조 원에서 6534조 원으로 무려 2772조 원(73.7%)이나 앙등했고, 토지가격은 6749조 원에서 1경 680조 원 (58.2%)으로 뛰어올랐다.
아래 표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동산 공화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이른바 피케티 지수다. 피케티 지수는 어느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 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 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이는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지수(11.6배)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인 11.9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피케티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이 수치가 9배를 넘어선 국가는 없었는데,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해 피케티지수를 계산하면 11.6배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동 수치가 9.8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지가 실감날 것이다.

국민순자산/국민소득 배율, 피케티지수출처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부동산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데다 피케티 지수가 지시하듯 부동산 자산이 소득을 짓누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은총재가 부동산에 초연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은총재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두려워하는, 부동산의 포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이 총재도 지적했듯 가계대출의 폭증은 부동산 구입과 절대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을 결단하지 않고는 가계대출을 축소시킬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피와 살이 튀지 않는 구조조정 없이 디레버리징은 불가능
이 총재가 현실을 직격하면서 정공법을 제시한 발언도 있다. 아래의 발언이 그것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미뤄서 경쟁력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추세는 정해진 미래라기보다, 어떤 구조개혁으로 대응하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조개혁을 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추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정곡을 찌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가계부채 축소도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미뤄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창용 총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다음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올려서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전쟁에 결연히 나서야 한다. 부동산은 이 총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