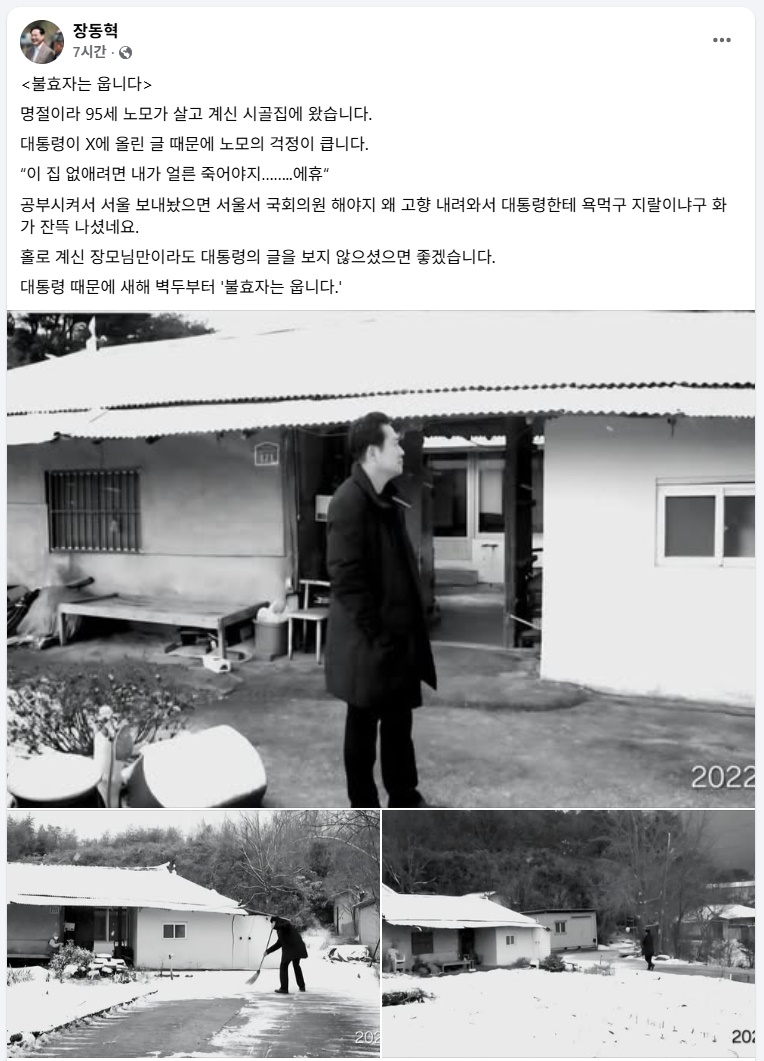국채 수익률 거침없는 상승세…시장금리 급락은 없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미국 채권의 실질수익률이 14년 만에 최고로 뛰어오르면서 주식 및 기업 부문의 유동성이 마를 것이란 예측이 대두됐다. 한국의 국채 수익률도 글로벌 긴축 기조 지속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의 요인으로 상승 중이다.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시장금리를 흔들 가능성이 높아 시장금리가 단기간 내에 급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미국 실질금리
미국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팁스) 수익률이 지난 7일 연 1.82%까지 올라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 5년 만기 팁 수익률도 연 2%를 상회했다. 흔히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 조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며,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을 측정하고 위험자산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오르면 결국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들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증시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라고 보도했다. 유동성이 위험도가 큰 주식 등을 선호하기보다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도 향상된 국채를 선호할 것이란 뜻이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10~15%는 돼야 하는데, 이는 경기의 폭발적인 성장과 기업이익의 급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실질금리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도 밀어 올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부문의 자금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피델리티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은행의 신규 대출 및 리스 발행액은 올해까지 연평균 2790억 달러에 불과했다. 2015~2019년 같은 기간 연평균 수준인 4810억 달러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 국채수익률 상승 → 시장금리 상승 → 예금금리 상승 → 대출금리 상승 → 기업여신 축소의 순환고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대출비용 상승의 영향이 내년 하반기와 2025년에 더 심각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미국 실질금리는 주식 등 자산시장과 기업여신 등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속 올라가는 국채 수익률
미국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반기에 안정되는가 싶던 채권수익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래 표의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을 보면 국고채권, 통안증권, 한전채, 산금채, 회사채 등이 모두 상승 중임을 알 수 있다.

국채 수익률. 출처 : 금융투자협회
모든 금리의 기준이자 토대라 할 국고채 수익률만 일별하자. 7월 10일 기준 5년물 국고채권은 3.81%를 기록해 연중 최고점인 3.907%에 접근 중이고, 대표적인 장기국채인 10년물 국고채권은 3.863%를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국고채권 20년물(3.778%), 30년물(3.77%), 50년물(3.748%)모두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통안증권과 한전채와 산금채의 상승세도 무서울 정도다.
시장금리의 조속한 급락 기대는 금물
미국 실질금리가 2009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는 사실, 국고채를 비롯해 채권시장의 대표적인 채권들의 수익률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지시하는 바는 명확하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며, 시장금리의 상승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가짜뉴스에 현혹돼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마련에 나서는 일은 극력 조심해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미국과 한국의 채권수익률의 상승 이다. 시장금리의 조속한 급락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난제들이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