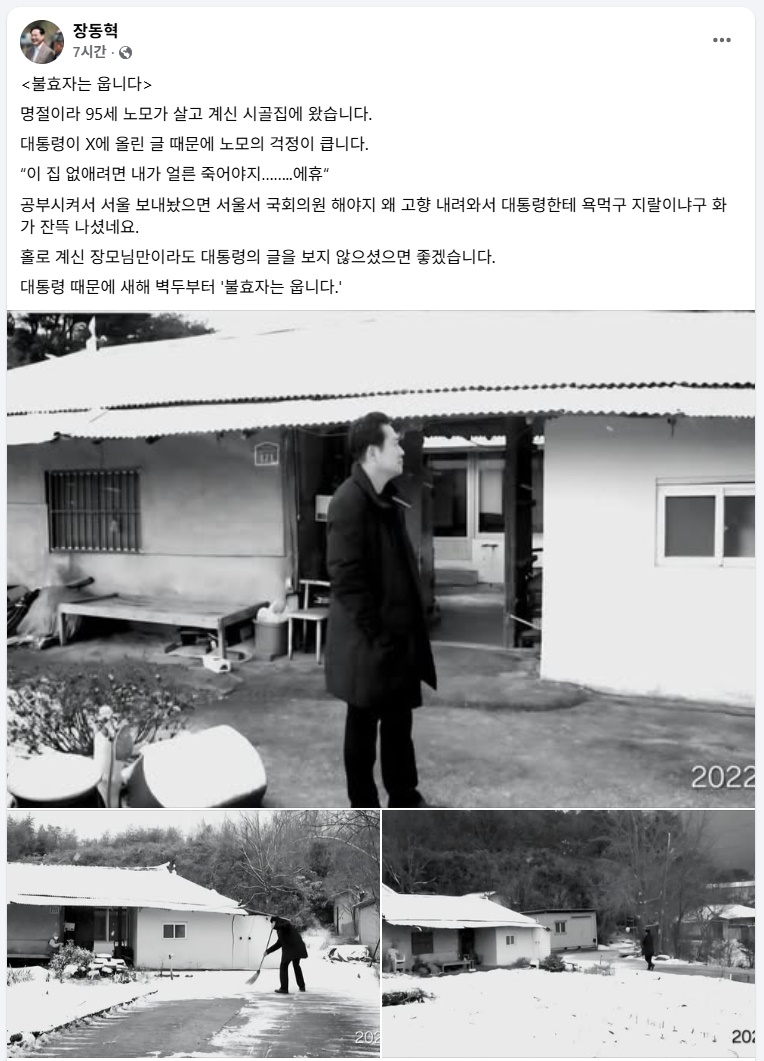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내 집이 없어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무려 1000만에 육박한다는 통계청의 통계가 나왔다. 물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는데 그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다. 집값이 너무 폭등하다보니 부담가능한 주택이 씨가 마른 것이다. 한편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대소득자들의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대한민국이 임대소득자의 천국으로 추락 중인데, 임대소득자들이 임차인들의 소득을 펌프로 뽑아올리듯 하는 나라에서 혁신기업이 융성하거나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건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다.
무주택가구는 1000만에 육박 중, 서울은 무주택 가구 비율 전국 최고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가구는 961만 8474가구로 집계됐다. 전년(954만 1100가구)보다 약 7만 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 가구)의 43.6% 수준이다.
무주택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다. 자가 주택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라는 뜻이다.
무주택 가구는 2020년 처음 9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년 만에 95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집값 상승에 더해 청년·고령층 저소득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 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경기 지역이 238만 2950가구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서울이 214만 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414만 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폭등하는 서울 집값…무주택자 비율 2년 연속 나홀로 상승 중
특기할 만한 건 2021년 51.2%였던 서울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2년 51.4%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2년째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전국 시도 중 2년 연속 상승한 건 서울이 유일하다.
반면 나머지 16개 시도는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전년과 비교해 2023년 무주택 가구 비율이 상승한 곳은 울산·강원도 2곳이었고 나머지는 보합 혹은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이 나머지 지역보다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고 최근 상승세가 뚜렷한 것은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지역은 이른바 ‘강남 불패론’ 탓에 매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가는 16.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1.7% 떨어졌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419.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집값을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는 식지 않은 부동산 투자 열기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천명이 사들인 주택은 총 4만 4260채로 1인당 무려 44채 꼴이다.

서울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을 찾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격
투기수요로 인해 서울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다 보니 부담가능한 주택들이 멸종되다시피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이다. 2012년 32.5이었지만 10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 수 비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가격 범위의 주택이 2012년엔 서울 주택 3채 중 1채에서 10년 만에 100채 중 3채로 급감했다는 뜻이다.
이제 서울은 중상층 이상이나 자기 집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완전히 재편됐다. 중상층 이상에 속하지 않는 가구는 서울에서 전월세를 전전할 수 밖에 없는 신세다.

서울 임대소득자 중 상위 0.1%는 연소득이 무려 13억 원
전월세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늘다보니 임대사업자들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귀속분 1인당 부동산 임대소득은 1774만 원으로 전년(1768만 원)보다 소폭(0.3%)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1인당 임대소득은 2408만 원에서 2456만 원으로 2.0% 오르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웃도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서울이 유일했다.
특히 상위 임대업자들이 올리는 임대소득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이는 36만 370명이다. 이들의 총임대소득은 8조 8522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한 사람당 평균 임대소득이 2456만 원인 셈이다. 이것만 보면 별 것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 임대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2억 9980만 원을 신고했다. 2022년(12억 8660만 원)보다 1.0%(132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7억 1842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6억 원가량 높다. 부산(5억 3449만 원)의 2.4배며, 경북·경남·대전·충북 등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더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2024년 귀속분에는 서울 임대소득 상위 0.1%의 약진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부동산 부자 및 임대사업자들의 천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혁신경제도, 자본시장 활성화도,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도 모두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