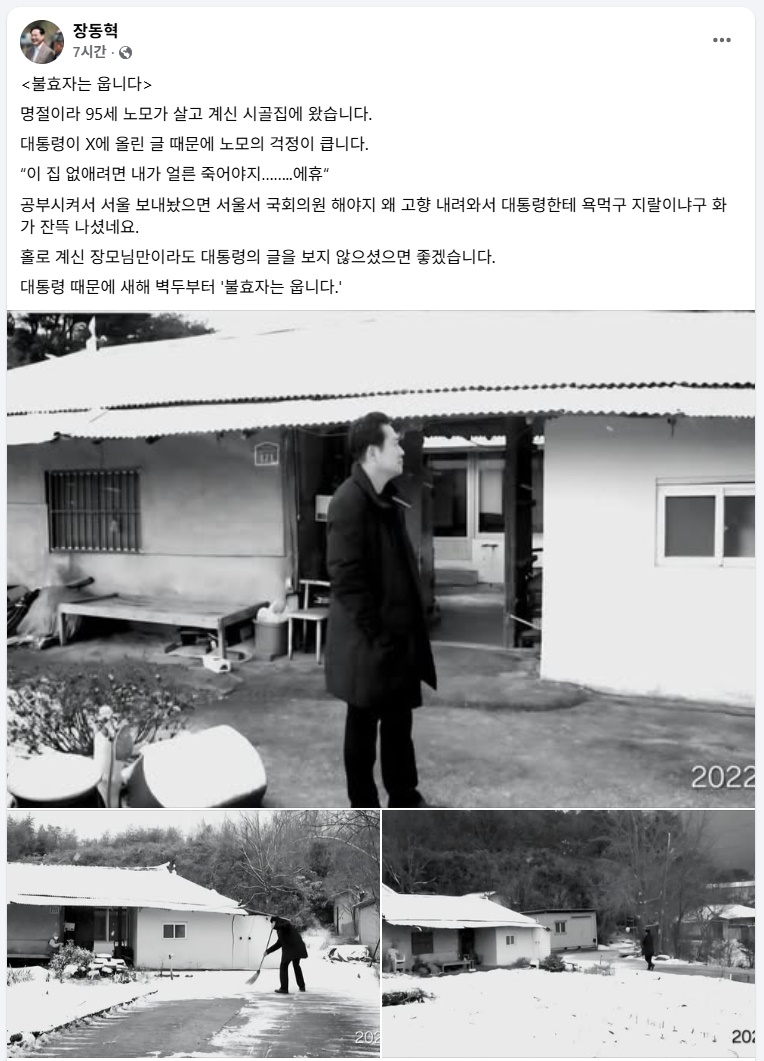서울 상가 경매 꽁꽁…2029년 오피스 공실률 14%?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경기침체의 쓰나미가 상가와 오피스 시장을 휩쓸고 있다. 상거래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것도 업무용 부동산을 위축시킨 요인이다. 경기침체 쓰나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정점에 위치한 서울 상가경매 시장도 예외 없이 덮쳤다. 낙찰률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최초 감정가의 10% 수준으로 떨어진 경매 물건도 등장했다. 서울 오피스 시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오피스 시장은 거래규모가 계속 줄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임대업 시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은행권은 임대업 대출을 바짝 조이고 있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먼저 얻어 맞은 상가와 오피스 다음 차례는 어디일지 궁금하다.
상가 경매, 최초 감정가 대비 10%대로 폭락한 매물 등장
28일 부동산 공·경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경매로 나온 상가(점포) 213건 가운데 39건만 새 주인을 찾는 데 성공해, 낙찰률은 18.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의 상가 낙찰률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10%선을 기록하게 됐다.
경기 불황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임차 수요가 급감하다보니 상가 공실이 늘고 자연스럽게 상가 경매 시장도 외면받고 있다. 심지어 최초 감정가의 10분의 1토막 수준으로 폭락한 매물도 나왔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한방 테마 상가 2층에 위치한 7㎡(건물면적 기준. 2평) 크기 점포는 지난해 5월 감정가인 5400여만 원에 첫 경매가 진행됐으나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미 10차례나 유찰된 이 상가는 다음 달에 감정가의 10분의 1 수준인 580만 원에 다시 한번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인의동의 한 귀금속 상가 2층에 있는 30㎡(9평) 크기 점포의 경우는 경매가가 첫 경매의 절반 수준인 1억 5000만 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지난 2월 첫 경매 때는 2억 9300만 원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세 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흔히 통상가로 불리는 근린생활시설도 예전 같지 않다. 서울 통상가의 낙찰가율은 2021년 3월 96.6%, 2022년 3월 119.4%, 2023년 3월 99.0% 등으로 감정가와 바짝 붙어있었으나, 지난해 3월 79.8%로 떨어진 이후 지난 달 76%를 기록하는 등 고전 중이다.
한때 입찰자들이 달려들던 중대형 상가의 인기도 옛 일이 됐다. 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하는 서울 중대형 근린시설의 지난달 낙찰가율은 76.0%로 전년 동기(81.2%) 대비 하락했다. 2년 전인 2023년 3월에는 130.4%로 경매가보다 30%를 더 얹어야 낙찰받을 수 있었다. 요컨대 서울 상가 경매시장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부진의 늪에 빠졌다.
2029년에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14%라고?
서울 오피스 시장도 사정이 어렵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오피스 시장의 총 거래액은 4조 798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50억 원 감소했다. 서울 오피스 거래액은 지난해 3분기 4조 5333억 원, 4분기 5조 532억 원 등으로 2024년 2분기(1조 702억 원) 이후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올해 1분기는 전분기 대비 5.0% 감소했다. 2분기도 전분기 대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기사정이 최악인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그 직격탄이 오피스 시장을 강타하는 중이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건 저금리 시대에 앞다퉈 착공했던 오피스 건물들이 줄지어 준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의 장기 고착화 가능성이 겹치면서 오피스 시장이 악화일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급은 많고 수요는 줄어드니 공실이 폭발적으로 늘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부동산전문 컨설팅업체인 젠스타메이트는 서울 오피스 건물 공실률이 2026년 8.7%, 2029년에는 14% 이상으로 폭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대출 고삐 조이는 은행권
임대용 부동산 시장이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자 은행들이 서둘러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부동산 임대업 기업대출은 전 분기보다 1조 8520억 원가량 감소했다. 8014억 원 줄어든 작년 4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커졌다.
개별 은행별 감소폭 확인이 가능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우리은행이 1조 3390억 원을 줄이며 가장 감소폭이 컸고, 하나은행은 9872억 원을 줄였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 4분기 부동산 임대업 기업대출 규모 자체는 각각 1조 3055억 원, 2194억 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직전 분기의 1조 5832억원, 7376억원에 비해 줄었다.
임대업 부동산 시장이 공실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데다 경·공매를 통한 대출금 회수도 여의치 않자 은행권이 임대업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임대업 부동산 시장 전망이 극도로 어두운 데는 은행들의 대출조이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강타당한 상가와 오피스 시장, 다음 차례는서울 아파트?
바닥을 모르고 무너지는 국내경제와 가시화되는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상가와 오피스 시장을 강타 중이다. 자영업 시장이 활황으로 돌아서고 기업 투자도 활발해져야 상가 및 오피스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상가 및 오피스 시장의 회복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제 관건은 상가와 오피스 시장을 휩쓴 경기침체의 파도가 어디를 향할 것인지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최정점에 위치하며 상가나 오피스에 비해 사용가치가 있는데다 하방 경직성이 강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그 다음 차례가 되진 않을까? 혹시 금융위원회가 서둘러 출시하려는 지분형 모기지 상품(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때 1억 8000만 원만 투자하면, 대출 4억 2000만 원과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4억 원을 지분 출자하는 상품)이 서울 아파트 시장을 떠받치려는 구원투수 역할을 부여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