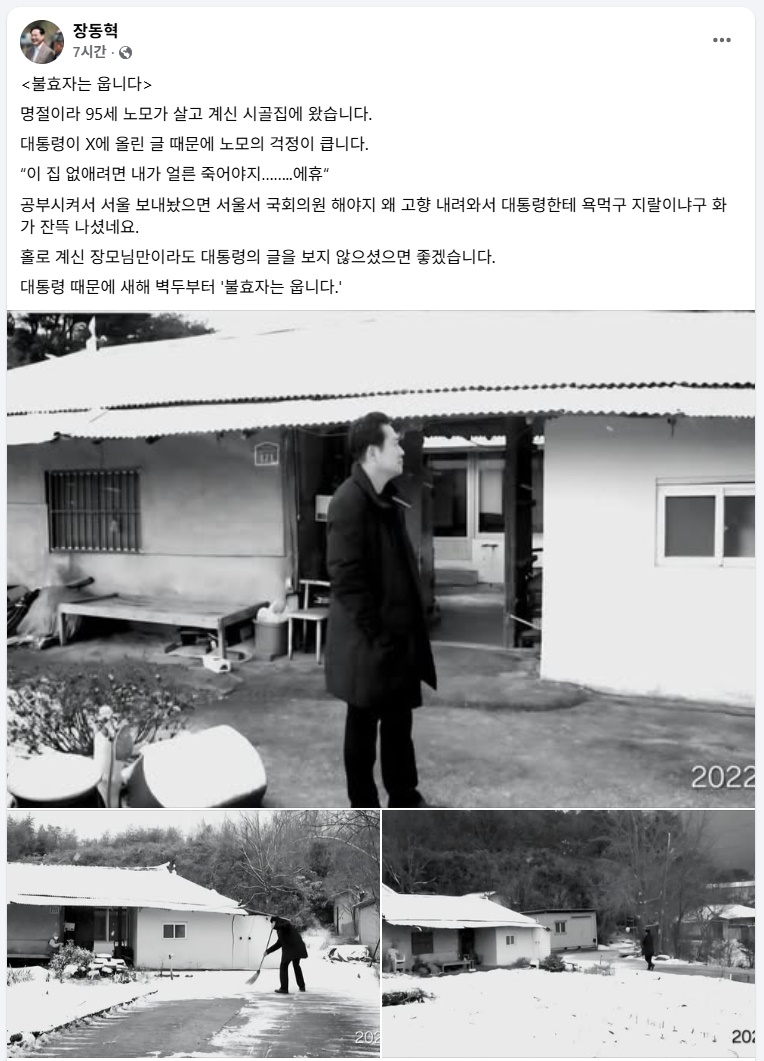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최정점에 위치한 압구정 신현대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무려 23억 원 하락한 거래가 나와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속출 중이라는 보도를 무색케하는 거래다. 서울의 랜드마크 단지들에서도 수억 원씩 가격이 하락한 거래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다시 꺾이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에 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압구정 신현대에서 22억 5000만 원 폭락 거래 나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압구정 신현대(현대 9, 11, 12차)에서 무려 23억 원 가까운 하락 거래가 등장해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5일 압구정 신현대(현대 9, 11, 12차) 183.41㎡가 90억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이 지난 6월 22일 기록한 최고가는 112억 5000만 원이다. 한 방에 무려 22억 5000만 원이 폭락했다. 이번에 거래된 아파트의 층수는 최고가를 기록했던 7층과 비슷한 6층이다.

수억 원씩 하락한 ‘한강벨트’ 아파트들 속속 등장
신현대 183.41㎡만 가격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 아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전용 155㎡가 지난 7월 14일 83억 원에 실거래 됐다.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인 6월 27일 같은 면적 아파트가 90억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보면 무려 7억 원 폭락한 가격이다. 또한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2차 전용 84㎡는 지난 6월 20일 실거래가 33억 원을 찍었는데, 지난 7월 4일 30억 원에 실거래됐다. 직전 대비 3억 원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상승장 때 성동구와 함께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포구도 심상치가 않다.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전용 84㎡분양권은 지난 7월 17일 19억 8903만 원(11층), 18억 4413만 원(1층)에 각각 실거래됐다. 지난 6월 28일 11층 입주권이 25억 90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무려 7억 원가량 폭락한 시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값)은 부동산 대책 발표 전보다 2억 원 넘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직방이 지난 6월 10일~7월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9000만 원에서 8억 7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 가량 하락했다.

6·27대책 영향 지속 중…서울 등 아파트 가격 상승세 다시 꺾여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 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는 0.10% 올라 상승률이 직전주(0.14%) 대비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6·27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6월 다섯째 주(6월30일 기준) 이후 5주 연속 둔화 양상을 이어가다가 6주 만에 확대됐지만, 한 주 사이 다시 축소 전환됐다.
서울에서 서초구(0.16)와 동대문·관악구(0.08%)만 직전주 상승률과 같은 보합세였고 나머지 22개 구는 같은 기간 상승률이 낮아졌다. 상승률은 송파구(0.31%)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성동구(0.24%), 서초구(0.16%), 강남·용산·광진·양천구(0.13%), 강동·영등포구(0.12%), 마포구(0.11%)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0.01% 올라 상승률이 직전주(0.02%) 대비 소폭 낮아지며 한 주 만에 오름폭을 다시 축소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과천시(0.22%), 성남 분당구(0.19%), 안양 동안구(0.18%), 하남시(0.14%)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 아파트값은 0.04% 떨어져 낙폭이 직전주(-0.02%) 대비 두 배로 커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4%로, 직전주(0.05%)와 견줘 소폭 떨어졌다.

부동산은 언급 자체를 꺼리는 정부
6·27대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언급을 극히 꺼리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에 해야 할 일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윈회의 발표 내용 속에도 부동산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123개의 국정과제 중에서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건 ‘주택공급 확대’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뿐이다. 이런 부실한 총론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및 주거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부동산·주택 분야와 관련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천명했다. 공적주택이란 공공주택에 더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주택을 포함한 개념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공공주택 비율 두 자릿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비율을 8%라고 보고 있지만, 20년 이상의 실질적 중장기 공공임대는 6%대에 머물며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는 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주택을 늘리는 건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나 ‘공적주택 공급확대’만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을 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세제와 금융 등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와 더불어 총체성과 유기성을 담보하면서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노려볼 수 있다.
비생산의 대표격인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관해 한사코 언급을 회피하는 건 기이한 일이다. 눈 앞에 존재하는 위험이 말을 아낀다고 사라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 문제와 정면대결하는 용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