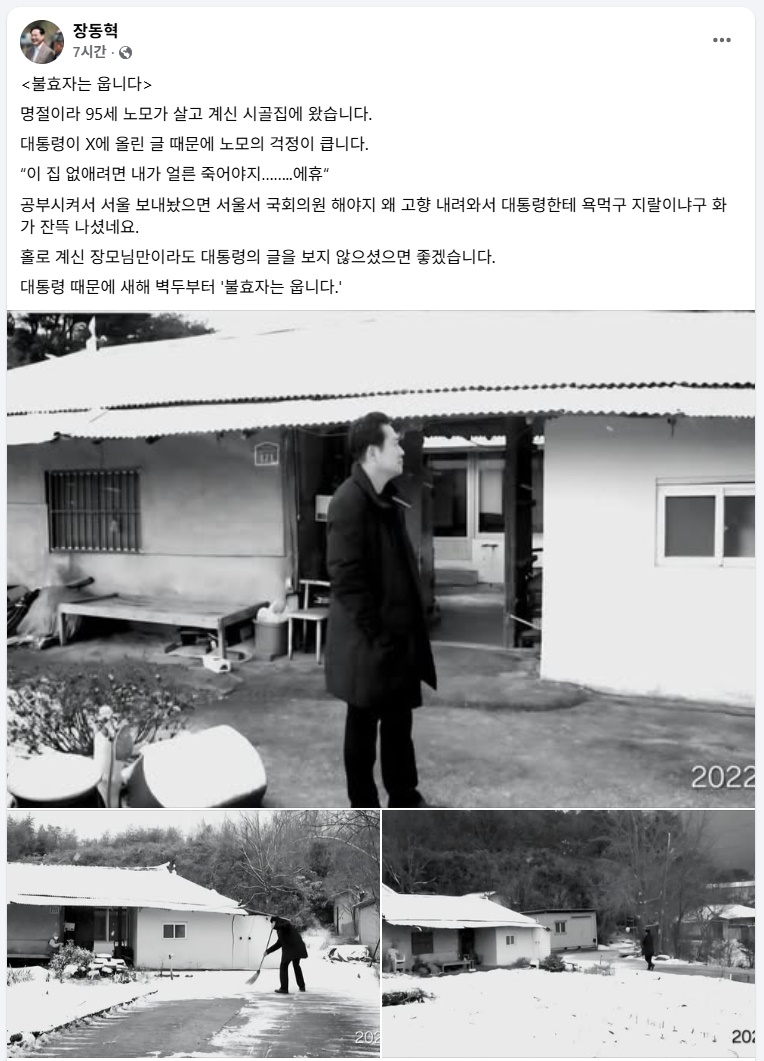[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기준금리, ‘높이’ 보다는 ‘길이’가 관건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은 금통위는 지난 달 24일 기준금리 0.25%의 베이비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가 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금통위 회의에서 베이비스텝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대비)이 7.7%로 시장 전망치(7.9%)를 하회했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기미가 보이니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목표와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 원/달러 환율 안정,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로 심화된 신용경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아파트 부동산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주택 아파트 부동산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공포가 지배하는 부동산 시장
금통위가 베이비스텝을 밟고, 윤석열 정부가 풀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거의 전부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21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52% 떨어지며 5월 마지막 주 이래 26주 연속 하락했다. 시황이 더욱 나쁜 건 3주 연속 최대 하락폭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장의 선행지표라 할 거래량은 더욱 충격적인데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의 경우 7월 644건, 8월 671건, 9월 610건, 10월 554건, 11월 395건(아직 신고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1천건을 하회할 가능성이 압도적이다)을 기록했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개월 연속 1천건 미만을 기록한 건 2006년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이후 최초일 뿐 아니라 이쯤 되면 거래가 멈췄다고 보는 것이 맞다.
기준금리 인상 쓰나미가 방아쇠 역할을 한 부동산 시장은 지금 공포가 지배 중이다. 아무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않으며 시간은 더 이상 매도자의 편이 아니다. 불과 1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수요건, 가수요건 시장에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금리의 방향성이 자산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그걸 섣불리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핵심은 고금리의 지속기간
물가상승률(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물가 등), 고용 관련 지표, 성장률 등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시장에서는 내년도 미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를 5.0~5.25%수준으로, 한국은행의 최종 기준금리를 3.5~3.75%수준으로 전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싶다.
문제는 이런 수준의 기준금리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입장에선 추세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금리라는 사실이다. 기준금리가 낮았을 때는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시장의 첨예한 관심사였지만, 기준금리가 자산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고금리에 도달한 지금에는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더 중요한 관심사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통상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내년 말에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는 내후년 여름이나 되어야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추세를 완전히 돌려놓기 위해서는 미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추세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2023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 박고 나섰다. 제롬 파월 의장의 측근이자 연준 내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달 28일(현지시각) 뉴욕경제클럽에서 연설 뒤 토론에서 “아마 2024년에 물가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쯤에야) 명목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윌리엄스 총재는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을 지점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에 무엇이 일어냐는 것에 달려 있다”며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에 좌우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0.12. ⓒ제공 : 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0.12. ⓒ제공 : 뉴시스한편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28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 배런스가 주최한 웹캐스트 인터뷰에서 “1970년대보다도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기를 원한다”면서 “내년 물가 압력이 둔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2024년까지는 (금리가)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책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종 금리 목표가 적어도 5.00~5.25%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물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필요는 없다. ‘일시적 인플레이션일 뿐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호언했던 파월 의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연준도 자주 틀리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 주요 인사들이 이른바 ‘연준 피벗’에 대한 시장의 성급한 기대에 지속적인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경시할 일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더구나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끈적하게(sticky)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달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열릴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와 함께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언제까지 지속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달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목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