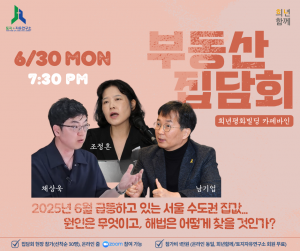저는 회사를 마치고 약간 늦게 도착했지만 지난주와 조금 달라진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지난 첫 번째 모임은 다들 처음 만나서 어색했는데, 두 번째 모임에서는 그래도 다들 한번은 봤다고(?)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치킨만 있는 게 아니라 피자까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승현 연구원님의 센스인가요?^^; 마지막 모임에는 과메기와 석굴까지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니… 배우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기대가 되네요..ㅋㅋㅋ
첫 번째 발제는 김형용님이 해주셨는데요. 칼 폴라니의 이중운동과 거대한 전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시장(경제)은 사회문화적 관계와 결합되어 사회의 일부로 기능해왔으나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사회문화적 관계 일체가 경제체제 규칙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경제원리와 사회의 자기보호원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중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시장경제의 위기에 대한 사회의 반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주의와 파시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니는 시장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인간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거대한 전환’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은 경제활동으로 인간존엄성이 회복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이루어 사회변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경제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신동민님이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유럽에서 제 3섹터는 시장과 국가 모두와 연관이 있었고 복지서비스라는 광범위한 영역 안에서 보호된 시장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지혼합’, ‘복지의 혼합경제’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시장과 국가의 실패로 인해 제 3섹터가 존재하게 된다고 보고 비영리부문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본의 힘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율적인 경제조직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사회적 기업과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과 의료생협 등을 예로 듭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지난 첫 모임에서도 계속 이야기 됐었지만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문화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딱 하나로 결론을 짓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대충 어림잡아 쉽게 생각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생각했었는데, 논문들을 읽고 이 모임을 거듭할수록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정의해야하며 어떤 조직의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뭔가 딱! 정립이 되는 게 없어서 토론에서 말하지 못하는 게 있기도 하구요. 하지만 이번 공부를 통해서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점점 알아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대안적인 움직임들이 조금씩이나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 번의 모임이 더 기대가 됩니다.


![[긴급 세미나] 보유세 강화로 한강 벨트를 잠재우라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골든타임 (12/4) [긴급 세미나] 보유세 강화로 한강 벨트를 잠재우라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골든타임 (12/4)](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11/긴급-세미나-보유세-강화_1024-211x300.jpg)
![[정책세미나]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8/18, 국회) [정책세미나]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8/18, 국회)](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8/LH의택지매각방식어떻게개혁할것인가2025_웹자보-238x3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