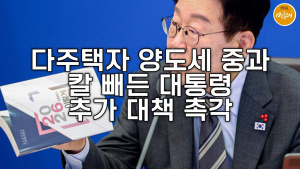가계는 여유, 기업은 돈가뭄…자금사정 극과 극 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올해 1분기 동안 기업과 가계의 자금사정은 극한 대조를 보였다. 가계는 부동산 구매가 격감하면서 여윳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기업들은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자금부족액이 크게 확대됐다.
가계 여윳돈 폭증, 주된 원인은 부동산 구매 격감과 대출급감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7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64.8조 원)와 비교해 1년 새 무려 12.1조 원이 늘었다. 증가액이 2020년 1분기(81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통상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계를 저축의 주체로, 기업을 투자의 주체로 상정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아래 〈표〉을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및 조달 추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자료=한국은행가계 자금운용 및 조달 추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및 조달 추이’를 보면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1분기 자금 운용 규모(69.8조 원)는 1년 전(89.2조 원)보다 약 19조 원 줄어들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예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예치금은 1년 전과 별 변화가 없었지만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이 크게 줄었고(11.9조 원→5.6조 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격감(6.6조 원→-3.8조 원)했다. 한편 자금조달이 1년 전의 24.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가계가 작년 1분기에 비해 대출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대출금을 무려 7조원이나 상환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1년 전에 비해 가계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보니 자금운용액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용 및 조달차액은 오히려 64.8조원에서 76.9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가계는 도대체 왜 대출을 일으키기는커녕 이미 낸 대출금을 상환하기까지 한 것일까?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및 조달추이를 살펴보면 가계대출이 작년 3분기부터 급감함을 알 수 있다. 작년 1분기 24.4조 원, 2분기 36.1조 원을 기록하며 폭증하던 가계대출은 작년 3분기 9.4조 원, 4분기 4.6조 원으로 급락하더니 급기야 올 1분기에 –7.0조 원을 기록했다. 작년 3분기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돌입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장금리를 터치하던 시기다. 아울러 기준금리의 융단폭격세례를 받은 부동산 시장이 장장 9년간의 대세상승을 마치고 가파르게 떨어지던 때다. 이자가 폭증하고 부동산이 폭락할 때 시장참가자들은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으며,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매각 등을 통해 서둘러 빚을 갚는다. 가계대출이 작년 3분기 이후 드라마틱하게 급락한 데에는 이런 배경과 맥락이 있었다. 참고로 1분기 가계의 자금조달액(-7조 원)과 금융기관 차입액(-11.3조 원)은 모두 역대 최소치다.
기업은 극심한 수출부진 등으로 1년 전보다 자금부족액이 7조 늘어
부동산 구매를 억제하고 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상환하는 등으로 여윳돈이 크게 늘어난 가계와 달리 기업들은 돈이 마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비금융법인, 기업들의 순자금 운용은 마이너스(-) 42.3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35.3조 원)에 비해 7조 원이나 조달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기업의 순자금운용이 본디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감안해도 심각한 상태다.
아래 〈표〉를 보면 비금융법인의 자금운용 및 조달 추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액이 격감했지만(117.8조 원→-3.9조 원), 예금 인출 등으로 자금 운용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82.5조 원→-46.2조 원)하면서 순자금운용액이 7조 원 더 감소하고 말았다. 참고로 1분기 자금운용액은 역대 최저 수준인데,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영역이익 감소, 고금리 부담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자료 = 한국은행기업 자금운용 및 조달 추이
부동산 하향안정화를 통해 가계 여윳돈 늘리고,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해야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 잠정치가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자명하다.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가계의 여윳돈이 늘어나고, 가계의 여윳돈이 늘어나야 소비도 증가한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대중국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야 기업들의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9만 1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386만 원)보다 고작 3.4% 불었을 뿐이다. 하지만 가계의 여윳돈은 1년 새 거의 18%p 순증했다. 부동산 시장의 대세하락을 맞아 가계가 부동산 구매를 줄이고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대출금을 상환했기 때문이다. 소득을 찔금 늘리기보단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계의 여윳돈 증가에는 압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편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묘방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 하수분(河水盆) 역할을 해 온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중국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려놓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자 규모는 118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5∼12월 52억 달러 적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또한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기여도는 지난해 5~12월 12.8%에서 올해 1~5월에는 43.2%로 폭증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기만 하면 무역수지가 안정적 흑자기조로 바뀔 것이란 뜻이다.
가계에 여윳돈이 넘치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고,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기업들이 살아날 것이다. 대한민국으로선 두 개의 강력한 성장엔진을 탑재하는 셈이다. 정답을 말해줬으니 윤석열 정부는 실행만 하면 된다.